※ 이 글은 전시 감상 및 문화유산 기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용된 사진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거나 일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처를 반드시 포함하겠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비영리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해당 작가·기관에 있으며, 요청 시 즉시 수정 또는 삭제하겠습니다.
1. 도입부

아미타삼존 후불탱은 무위사 극락보전 중앙에 불상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
극락전은 공사 중 상량문을 통해 세종 12년(1430)에 건설되었고, 화기를 통해 성종 7년(1476)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후불벽의 벽주는 대공 첨자에 고정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아미타삼존, 배후에는 백의 관음도가 있다.
화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향우측은 제작 시기, 시주자, 화사, 화주를 향좌측은 시주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후원자 구성을 보면 다양한 신분층이 보이는데 특히 왕실의 후원이 눈에 띈다.
이는 당시 무위사가 수륙사이자 자복사로 왕실의 비호를 받았기에 후원이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불탱 뒷면에는 유려하고 간결한 필치로 백의관음이 묘사되어 있어, 전면의 도상과 함께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직접 방문했을 당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극락보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점이 너무 아쉽다.

세로 270cm, 가로 210cm 크기의 흙벽에 그려진 후불화는
화면 바깥 테두리에 백색, 안쪽은 붉은색으로 칸을 만들고 안에 불보살을 배치한 구조다.
도상의 근원은 정토삼부경으로 전통적인 협시인 관음, 대세지가 아닌 관음과 지장보살이 협실로 자리하고 있다.
2. 아미타여래
아미타여래는 높은 육계에 정상 계주가 있으며, 붉은 가사를 걸쳤다.

연화대좌는 수식을 양 끝에 달고, 중단에는 동물문이 표현되어 있다.
결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는데, 발이 드러난 상태로 발목의 옷자락은 조선 시대 불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광배는 연봉형으로, 거신광·두광·신광이 각각 표현되어 있으며,
거신광 안쪽에는 연화당초문, 바깥쪽에는 화염문을 시문했다.
대의에는 금니로 화원문을 그렸고, 가슴에는 범자가 새겨져 있다.
얼굴은 장방형의 풍만한 형태로, 나발은 흑선으로 윤곽선만 표현했는데 섬세한 필선이 돋보인다.


수인은 중품중생인으로 예리한 손톱 표현은 예리한 손톱 표현은 고려 불화의 전통을 일부 계승한 요소다.
왼손은 다리 위에 얹힐 정도로 낮게 내려가 있고, 옷 주름은 오메가형으로 접혔다.
승각기는 가슴까지 묶여 있으며, 오른팔의 대의를 투명하게 표현한 점이 주목된다.
3. 관음보살

왼쪽의 관음보살은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으며, 높은 보관에 화불이 있는 형태이다.
보관에서 나온 긴 보발이 어깨 위로 내려가며, 전체적으로 투명한 베일을 덮고 있는데 마엽문을 시문했다.
귀고리는 단추 모양으로, 승각기는 아미타여래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다리를 벌리고 있어 안정감이 느껴지며 양손을 교차하고 있는데 정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4.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두광, 신광을 갖추고 있으며, 투명한 두건을 쓰고 있다.



두건에는 금니로 작은 원을 채워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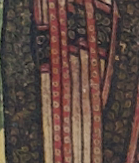
양손에는 투명한 보주와 석장을 쥐고 있고, 적색 치마는 연화당초원문 법의에는 목단당초원문
군의와 가사에는 당초문, 연주문 등 다양한 문양을 화려하게 넣었다.
5. 나한


삼존 위로 구름이 깔려 있고 그 속에는 6명의 나한이 있다.
구름은 독립된공간을 조성하며, 나한과 보살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준다.



나한은 좌우로 각각 세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가사에 화문 점문 등을 시문했다.
왼쪽은 머리를 먹색으로, 오른쪽은 녹청색으로 표현했다.
자세는 구름에 가려져 알 수 없지만 모두 합장한 형태로 추정된다.


여래에서 나온 서기는 상단으로 뻗어나가는데 양 끝에 화불이 있고 화불과 서기 사이에는 꽃비가 수놓아져 있다.
6. 백의 관음도

관음 신앙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토착 신앙과 융합해 다양한 형태의 관음이 등장했는데, 무위사에서 여러 속성의 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보이는게 흰 천의를 입은 백의관음, 선재동자 + 쌍 죽의 모티프를 가진 수월관음, 연꽃 한 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도해관음이다. 중심이 되는 백의관음은 백의관음예참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고려 후기~ 조선 초기에 매우 유행했다.
이를 주석한 백의해는 목판본으로 내용은 무량수국으로의 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방형으로 구획한 화면 안 보살에는 신광과 두광이 갖춰져 있다.
관음은 일렁이는 파도 위에 연잎을 타고 있으며, 당당한 체구와 수염에서 남성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성화된 중국의 관음이 아닌 고려 불화의 양식과 도상을 계승한 것이다.
시선은 하단의 왕생자를 향하고 있다.
보관과 백의 자락은 오른쪽으로 펄럭이고 아래쪽은 주황과 노랑 구슬이 있다.
커다란 귀, 뚜렷한 삼도, 가슴의 연꽃 형태의 영락은 이중으로 표현되어 있고, 팔찌를 끼고 있는 양팔은 손목부분에서 교차하여 왼손은 정병, 오른손은 버들나무 가지를 들고 불투명한 백의가 팔을 덮고 가슴 아래쪽에 띠가 묶여있다.
오른쪽 하단은 수월관음에서 많이 보이는 선재동자가 아닌 노비구가 경배하며 합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고전적이고 관념적 이미지를 벗어난 새로운 구도자의 모습을 표현했고, 등 뒤의 청조는 중생과 어울리는 존재로 노비구의 굽은 등에 앉아 관음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다.
왼쪽 상단에는 화기가 아닌 낙산관음찬에 수록된 5언의 율시가 있다.
海岸孤絶處 中有洛迦峰 大聖住不住 普門逢不逢 明珠非我慾 靑鳥是人遂 但願蒼波上 親添滿月容
항상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틀린 부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진출처
1.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2014년 국보 동산 앱사진)
- 신광희. 「강진 무위사 〈아미타여래삼존 벽화〉의 화승과 화풍 검토」. 『미술사논단』 52. 2021. 쪽 7-29.
- 최선일.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벽화」. 『경주문화연구』 5. 2002. 쪽 253-278.
- 배종민. 「강진 무위사 극락전과 후불벽화의 조성배경」. 『고문화』 58. 2001. 쪽 119-136.
- 장충식, 정우택. 「무위사 벽화 백의관음고 – 화기와 묵서게찬을 중심으로 –」. 『정토학연구』 4. 2001. 쪽 61-95.
- 이경화. 「무위사 극락보전 백의관음」. 『불교미술사학』 5. 2007. 쪽 263-287.
- 이승희. 「무위사 극락보전 백의관음도와 관음예참」. 『동악미술사학』 10. 2009. 쪽 59-84.
'문화유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작품소개] 괘불 (2) | 2025.05.26 |
|---|---|
| [작품소개] 십장생도 (1) | 2025.05.09 |
| [통도사 성보 박물관]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0) | 2025.03.30 |
| [국립중앙박물관] 변상벽필 묘작도 (0) | 2025.03.23 |
| [불교중앙박물관] 봉선사 비로자나불삼신 괘불도 (4) | 2025.03.16 |


